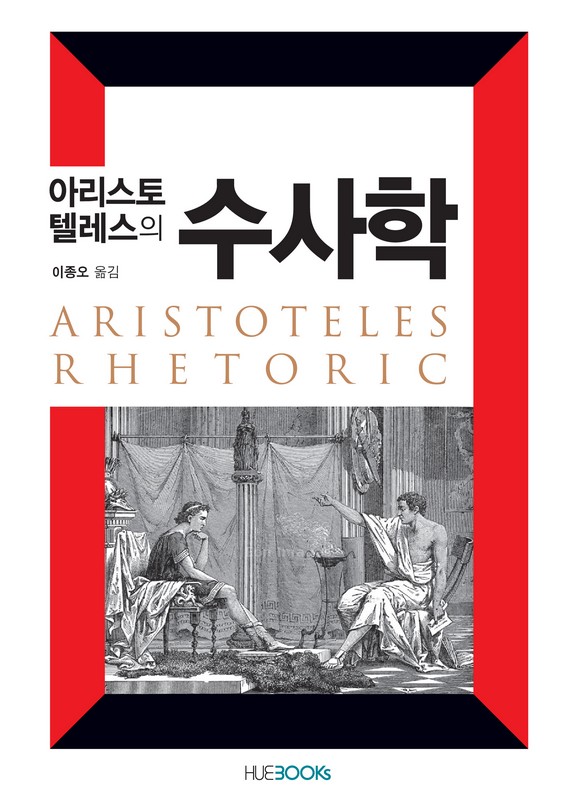
수사학은 웅변술, ‘말 잘하기 기술’, 변론술, ‘설득의 기술’이다. 사실 모든 수사학은 플라톤의 것을 제외한다면 다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시학과 수사학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의『 수사학』은 인간 정신의 창조적 행위에는 수많은 ‘기술(Techne)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승인 플라톤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술자들’(코락스, 칼리프, 테오도르의 사람들)이 맹신했던 관례적이고 관습적인 ‘하나의 기술’을 무시했고 경멸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이라는 플라톤의 철학적 어휘를 자유롭게 변용, 수용하면서 기술을 창조된 대상이아니라, 창조적 동인으로 간주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설득 방식을 구축한다. 그에 따르면 기술은 창조하는 정신의 ‘기능’ 또는 ‘능력’이며, 인간 활동의 양식들에 창조적 기능을 제시한다. 수사학은 플라톤의 것을 제외한다면 다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시학과 수사학에 관한 논의의 출발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담론의 현상과 관련된 상이한 두 개의 논문 「작시술Techne poietike과 수사술Techne rhetorike」을 썼다. 전자는 상상적인 환기의 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일상적인 대화술과 공개석상의 담론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작시술이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나아가는 작품의 진행을 규칙화하려한 것이라면, 수사술은 사고에서 사고로 나아가는 담론의 진행을 규칙화 하려한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이 두 논문은 후일 인간행위의 재현과 논증을 통한 설득, 즉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시학과 수사학에 관련된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문학(글쓰기의 총체적인 행위)의 기원에 관한 의문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1대학에서 수사법(아이러니, 과장법, 완서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7~18세기 프랑스 수사학자(라미, 뒤마르세, 콩디악)의 저서를 해제(解題)하는 연구를 했으며, 『문체론』, 『소통문화의 지형과 지향』(공저), 『문체론사전』(공저)을 썼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