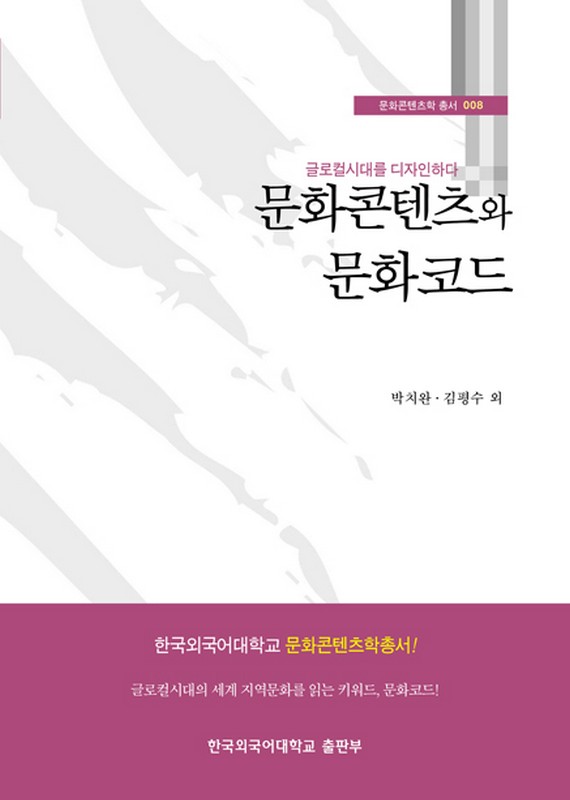
이 책에서 우리는 이른바 ‘글로컬’의 관점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문화코드를 분석해 보았다. 문화적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오늘날 이문화의 이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곧 문화적 지역성이 여전히 화두란 뜻이다. 부언하건대 할리우드식의 글로벌문화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로컬’ 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우리가 이 책에서 분석한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문화코드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고 사료된다. 문화콘텐츠산업은 ‘글로벌’만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그에 앞서 각 문화의 ‘로컬’에 깊이 천착해야 한다. 로컬이 없는 글로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글로벌문화는 로컬문화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만 성립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갈등의 근원―문화코드의 비교연구(김형인), 영국의 문화코드: 전통과 혁신(김성수), 글로컬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도의 문화코드(김윤희), 문화코드로 읽는 일본의 문화콘텐츠(박경아), 현대중국의 문화코드(김형준), 문화코드를 활용한 러시아 문화콘텐츠의 이해(장정희), EU의 문화코드와 문화정책(홍종열), 한국사회의 문화코드와 문화콘텐츠(김평수), 일본인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한류(나까무라 마유), 글로벌시대의 문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박치완)
박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프랑스 부르고뉴대학교에서 베르그송의 방법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는 주로 비주얼컬처, 글로컬문화, 상상력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키워드 100으로 읽는 문화콘텐츠 입문사전』(공저),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 유전자』(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글로컬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새로운 지형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