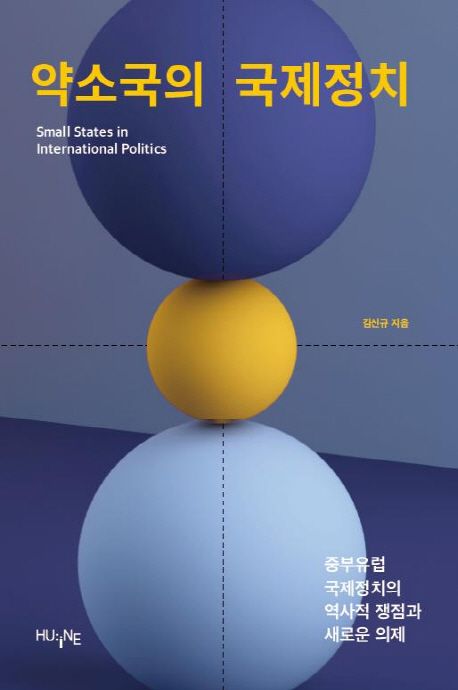
이 책은 약소국으로 분류되고 인식되고 있는 중부유럽 국가들의 생존과 발전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약소국에 대한 정의와 중부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어서 개별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시기별, 주제별 의제를 살펴본다. 약소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부유럽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주역으로 등장한 적이 없던 약소국이다. 중부유럽에 위치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은 국토의 규모나 인구의 차이가 있지만, 서쪽의 독일과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왔으며, 지역갈등과 국내요인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없었던 국가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부유럽을 완충지대, 무인지대, 안보의 진공지대 등으로 지칭하며 이 지역의 불리한 지정학적 요인이 유럽의 분쟁을 불러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왔으며, 이제는 직접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이들 약소국이 국제관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들이 이전에 선택했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선택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과거 안보를 수요했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만약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그동안 국제관계에서 배제되어 왔던 다른 약소국도 중부유럽의 성공요인에서 교훈을 얻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체코 프라하 카렐대학교(Karlova Univerzita) 교환교수, 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동대학 체코슬로바키어과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전략지역심층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2016)??, ??중부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2014)??,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 한국에 주는 의미(2014)??, ??체코와 국제정치: 역사적 쟁점과 새로운 의제(2013)?? 등을 작성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반-유로, 반-난민, 반-기성의 정치: 2017년 10월 체코 총선을 중심으로(2018),” “비세그라드 협력: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EU 아젠다 변경(2018),” “제트-레그 증상 극복과‘정책-설정자’로의 전환: 비세그라드 협력(2017),” “공산국가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과 통과국의 역할: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대규모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2016),”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 ‘이행경험 이전’ 전략과 효율성 증진 방안(2016),” “마사리크(T. G. Masaryk)의 민주주의: 재해석과 현대적 평가(2015),” “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분석: 체코의 하원 선거법과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사례로(2014)” 등이 있다.
